마르세유는 유유자적 휴양을 누리거나 볼거리 많은 관광지는 아니다. 그렇다고 ‘노잼’ 도시라 속단하지는 말자. 눈도장 한번 찍고 떠나기엔, 도시의 내공이 만만찮다. 마르세유는 프랑스에서 파리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장장 2,600년을 이어온 유구한 역사 덕분에 유럽의 문화수도로도 지정되었다. 연중 쾌청한 하늘과 마르지 않는 샘처럼 내리쬐는 햇살, 윤슬을 헤치고 출항하는 선박, 항구에 정박된 새하얀 요트 행렬, 청명한 지중해를 터전으로 삼은 사람들의 활력, 노랗게 채색된 건물의 화사한 색감, 주홍빛 석양의 몽환적인 무드까지…. 카메라 프레임에 걸린 마르세유는 대충 찍어도 한 편의 예술 작품 못지않다.
그런데 이 유구한 도시가 불과 20년 전만 해도 쇠락의 분위기가 역력했다.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의 바닷길을 잇던 항구는 낙후되고, 다양한 국적의 이민자가 몰려들며 치안도 불안했다. 도시 재정비를 위해 마르세유의 심장부로 불리는 옛 항구(Vieux Port)부터 이미지 변신을 꾀했다.
이곳은 ‘ㄷ’ 자 형태의 항구 주변으로 볼거리와 먹거리가 즐비한 마르세유의 중심지다. 항구에는 ‘내 평생 이렇게 많은 요트를 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요트가 정박해 있다. 항구의 풍경은 시시각각 변한다. 이른 아침엔 당일 잡은 생선과 해산물을 파는 활기찬 피시 마켓이 열리고, 오후엔 쉴 새 없이 출항과 입항을 반복하는 요트를 보려는 여행객의 발길이 이어진다.
특히 여름에는 마르세유 근처 섬으로 향하는 피서객까지 몰려들어 한층 북적인다. 특히 소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배경이 된 이프섬과 한적한 해변에서 망중한을 보내기에 제격인 프리울섬으로 향하는 페리 선착장과 매표소 앞으로 긴 줄이 늘어선다.
참고로 섬에 갈 계획이라면, 마르세유 프리패스를 끊는 게 가성비가 높다.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주요 관광지 입장권, 관광 열차 혹은 시티투어 버스 탑승권 등이 포함되며, 요금은 성인 27유로(약 4만원, 24시간)다. 부지런히 돌아다니길 좋아하는 ‘엣프피(ESFP)’라면 무조건 구매를 추천한다.
사방이 뻥 뚫린 탓에 지중해의 바람을 온몸으로 느끼다 못해 아찔한 스릴감까지 전해지는 대관람차와 마르세유 인증 사진 명소로 사랑받는 파빌리온(Pavilion)도 항구의 주요 볼거리다. 영국 건축가 노먼 포스터가 지은 파빌리온은 ‘거울 천장’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는 대형 조형물로, 잠시 그늘에서 땀을 식히며 천장으로 비치는 거울 속 모습을 사진으로 남기기 좋다.
하지만 옛 항구의 랜드마크 마르세유를 대표하는 건축물을 꼽으라면 단연 ‘유럽과지중해문명박물관(MUCEM)’이다. 그만큼 뮤셈의 존재감은 압도적이다. 뮤셈은 옛 항구 오른쪽 끄트머리에 자리한 생장 요새(Fort Saint-Jean)와 한 몸을 이룬다. 생장 요새는 프랑스 절대군주이자 태양왕 루이 14세가 시민의 반란을 막기 위해 지은 요새로, 적을 겨눠야 할 포문이 바다가 아닌 육지로 향한 것이 특징이다.
생장 요새와 다리로 연결된 뮤셈은 유럽 지중해 문명의 역사를 보여주는 최초의 박물관으로, 전시를 비롯한 각종 박람회와 컨벤션이 열린다. 건축가 루디 리치오티가 설계한 그물망 모양의 콘크리트 외관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다는 의미 외에 항구라는 공간적 특성과도 이질감 없이 어울리며 현대 건축의 정점을 찍는다.
특히 옥상 테라스는 구불거리는 그물망 사이로 청명한 지중해를 눈에 담으며 바람과 햇살을 온전히 만끽하는 명당이다. 온 세상이 로제 와인빛으로 물드는 해 질 무렵의 장관은 놓치지 말아야 할 최고의 순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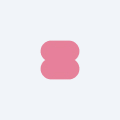
![[환율 전망] 중동 불안에 극심한 변동성 장세](https://cdn.kbthink.com/content/dam/tam-dcp-cms/webadmin/thumbnail/investment-01-pc.jpg)
![[미리보기] 3월 1주차 금융시장 전망](https://cdn.kbthink.com/content/dam/tam-dcp-cms/webadmin/thumbnail/investment-02-pc.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