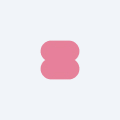이승과 저승의 경계가 이곳은 아닐까. 천국으로 향하는 관문에 서 있는 건 아닐까. 발자국도 길도 안 난 벌판 위에서 별별 생각이 다 든다. 여름철 이 땅은 낮도 낮이고 밤도 낮이다. 백야의 시간 속에서 지금이 현실인지 환상인지도 모호하게 느껴진다. 경험보다 상상에 더 가까이 기억되는 곳, 노르웨이 로포텐이다.
환상이 현실로, 노르웨이 로포텐
작게
보통
크게
목차

로포텐에서 가장 유명한 트레킹 코스인 레이네브링엔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 태곳적 지구의 모습을 상상하게 한다.
일상과 여행의 완충지대, 스볼베르

로포텐 제도에서는 해안 드라이브와 트레킹, 캠핑 등을 통해 자연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로포텐 제도에서는 해안 드라이브와 트레킹, 캠핑 등을 통해 자연과 한층 가까워질 수 있다.
로포텐(Lofoten)은 북극해에 떠 있는 섬 68개로 이뤄진 군도다. 사람이 사는 동네보다 야생동물의 터전이 훨씬 더 넓고, 차도만큼 트레킹 코스가 발달했다. 산행, 낚시, 보트와 요트 투어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거나, 해변과 절벽 위를 가로지르며 느긋하게 드라이브하기도 좋다.
로포텐의 주요 관문은 최대 도시 스볼베르(Svolvær)다. 로포텐의 행정과 상업 중심지인 만큼 페리와 여객선이 수시로 오가고 스키와 승마, 해양 관광 등 레저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즐길 수 있다. 스볼베르에서 출발하면, 고속도로 E10을 타고 서남쪽으로 달리며 로포텐 군도를 두루 훑기 좋다.
중간중간 국도로 빠져 호수와 바닷가 마을을 탐색한 뒤 다시 도로를 달려 서남단 땅끝마을 오(Å)까지 방문하는 여정이다. 스볼베르는 ‘최대 도시’라는 말이 무색하게 인구가 5,000여 명에 불과하다. 연간 여행객이 20만 명이라 해도 인구밀도가 낮으니 낮이든 밤이든 여유로운 편이다.
사람과 부대끼던 일상이 하루아침에 달라지면 숨통이 트이는 듯하면서 한편으로는 공터에 혼자 선 듯 불안감이 들 수 있는데, 스볼베르는 완충지대가 되어준다. 대형 마트와 은행, 호텔과 박물관, 관광 안내소 등 익숙한 시설이 자리해, 짐 가방을 정비하며 북극의 분위기에 서서히 물들 수 있다.
로포텐 제도는 페리로 이동할 수도 있다. 노르웨이 본토 보되(Vodø)에서 모스케네스(Moskenes)행 또는 스볼베르행 페리가 오간다. 모스케네스에서 내린다면, 땅끝마을 오를 방문한 다음, 동북쪽으로 이동하는 여정을 짜면 좋다.
로포텐의 베네치아, 헤닝스베르

로포텐에서는 대구를 비롯한 생선 요리를 꼭 맛봐야 한다. 큼직한 생선 커틀릿을 통째로 넣은 버거.

헤닝스베르는 섬과 섬 사이가 긴 다리로 연결돼 있어 해안 드라이브 코스로도 인기다.

로포텐은 대구 산업이 발달했다. 헤닝스베르에서는 대구 덕장을 흔히 볼 수 있다.
헤닝스베르(Henningsvær)는 건축과 예술, 역사까지, 로포텐의 상징을 두루 경험할 수 있는 마을이다. 운하를 따라 수상 목조 가옥이 늘어서 ‘로포텐의 베네치아’라고도 한다. 예술가의 작업실과 갤러리, 굿즈 숍을 비롯해 바다로 둘러싸인 잔디 축구장, 로포텐에서 손꼽히는 대구 요리 맛집까지, 여행자를 사로잡을 멋진 명소가 두루 포진해 있다.
헤닝스베르에 들어서기 전에는 페스트보그틴(Festvågtind) 등산이 필수 코스다. 체력이 허락하는 한 반드시 가볼 만하다. 높이 솟아오른 수직 바위는 암벽등반 코스. 그 아래 길도 나지 않은 돌무더기를 지나 아슬아슬한 절벽 구간까지 통과한다.
험준한 산길을 오르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정상에 오르면 헐떡임이 단숨에 멎을 만큼 빼어난 풍광이 펼쳐진다. 오묘한 코발트블루 바다, 가늘고 긴 다리가 섬 여러 개를 실처럼 꿴 모습…. 그 주변으로 가닛과 에메랄드, 비취를 연상시키는 초록빛 섬들이 흩뿌려져 있다. 자연과 문명이 이질감 없이 어우러진 장관이다.
헤닝스베르에는 대구를 말리는 덕장과 가공 공장이 많다. 나무 기둥을 삼각뿔 형태로 엮어 손질한 대구를 널고 바람과 햇볕에 꾸덕하게 말린다. 꼬들꼬들한 생선 살은 비린내가 거의 나지 않는다. 대구는 구이, 튀김, 수프 등 다양하게 조리한다.
마을 규모가 작은 만큼 식당이 많지는 않지만, 어느 곳에서든 기본 이상의 요리를 맛볼 수 있다. 그중 풀 스팀 헤닝스베르(Full Steam Henningsvær)는 깔끔하고 담백한 대구 요리를 선보이며, 한쪽에 마련한 박물관을 통해 로포텐 어업의 역사와 대구 가공 방식 등을 자세히 소개하니 들러보자.
시공간을 넘어선 온화한 땅

우타클레이브 해변에서 만난 양 두 마리. 우타클레이브 해변은 캠핑 성지로도 유명하다.

대자연을 마주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백패커.

로포텐은 과거 바이킹족의 본진이었다. 로포트르 바이킹 박물관에서는 바이킹족의 배를 타는 등 생활 체험도 할 수 있다.
헤닝스베르에서 레이네(Reine)로 향하는 한적한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 뜬금없이 넓은 주차장이 등장한다. 그 너머 야트막한 언덕에는 성벽처럼 길고 웅장한 건축물이 자리한다. 로포트르 바이킹 박물관(Lofotr Viking Museum)이다. 노르웨이 바이킹의 역사와 생활상을 보여주는, 노르웨이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박물관이다.
박물관 터는 서기 500년경 바이킹 부족장의 집이었다. 1980년대 이 일대에서 바이킹 부족 유물이 발견되어 대대적으로 발굴했다. 건물은 길이가 무려 83m에 달했고, 교역용 장신구와 모피,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유물도 출토되었다.
발굴을 마친 뒤에는 당대 건축양식을 복원해 박물관을 지었다. 바이킹 지배층의 삶을 유물과 영상으로 보여주고, 매년 8월에는 바이킹 축제를 열어 당시 삶을 생생히 재현한다. 도끼를 던져 과녁에 꽂거나 바이킹족의 배를 타는 체험을 어디에서 또 할 수 있을까.
박물관에서 차로 30여 분만 달리면 우타클레이브(Uttakleiv) 해변과 헤우클란(Haukland) 해변에 다다른다. 북극해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이국적인 바다다.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닷물과 조각 같은 바위 등 지중해를 연상시키는 풍광을 자랑한다. 스위스 평원에서나 볼 법한, 양 떼가 느긋하게 풀을 뜯는 모습도 해변가 언덕에서 볼 수 있다.
내륙 산지에서나 만날 풍경을 북극해에서 마주하는 셈이다. 우타클레이브 해변은 캠핑 스폿으로도 인기다. 넓고 평평한 사이트에 온수가 나오는 화장실까지 갖췄다. 두 해변은 길이 4km가량의 트레킹 코스로도 이어져 있다. 비교적 평탄하고 길이 잘 나 있어, 산책하듯 무리 없이 즐길 수 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여정, 레이네

뾰족한 산봉우리를 배경으로 트레킹을 즐기는 가족.

로포텐에서는 누구에게나 ‘자연을 누릴 권리‘가 주어진다.

레이네브링엔에서는 계단 1970여 개를 올라야 환상적인 풍광을 마주할 수 있다.
레이네는 로포텐을 상징하는 여행지로, 가장 유명한 하이킹 코스와 유서 깊은 건축 유산을 모두 품은 곳이다. 로포텐의 해안 마을에서는 동화 속 한 장면 같은 가옥을 흔히 만날 수 있다. 선명한 원색의 목조 주택 로르부에르(Rorbuer)로, 과거 어부들이 겨울 한철 머무르며 그물을 손질하고 물고기를 말리던 오두막이다.
로르부에르는 근대화와 함께 대구 어업이 대형화하며 본래의 쓸모를 잃었다. 대신 많은 곳이 개조를 거쳐 여행자의 이색 숙소로 활용되고 있다. 레이네를 비롯해 옆마을 함뇌위(Hamnøy)까지, 게스트하우스나 호텔로 운영하는 로르부에르가 많다. 몇몇 방은 가격이 특급호텔 숙박비를 훌쩍 넘어서지만, 테라스 밖 풍광만으로도 제값을 한다.
숙소에 짐을 풀고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레이네브링엔(Reinebringen). 해발고도 470여 m의 산봉우리로, 계단 2,000여 개를 올라야 정상에 다다를 수 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계단 없이 돌무지를 걷는 트레킹 코스였다고. 사면이 워낙 가파르고 미끄러운데도 유명세를 타고 인파가 줄을 이었고, 그만큼 낙석과 안전사고가 자주 일어나자 길을 정비했다.
계단은 네팔의 셰르파가 놓았다. 히말라야 절벽을 수시로 오르내리며 ‘실전 근육’을 다진 이들을 고용해 2019년까지 계단 1,970여 개를 설치했다. 그 덕분에 여행자는 산비탈에서 구를 위험이 훨씬 줄어들었고, 비교적 안전하게 로포텐 최고의 경관을 마주할 수 있다.
레이네브링엔을 오른다면 이 문장을 꼭 기억해야 한다. ‘전부 혹은 전무(All or nothing)’. 계단을 오르는 동안은 그저 그런 풍경에 별다른 감흥이 없을 수 있다. 가파른 경사에 숨이 턱까지 차올라 그냥 내려가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오래 자주 숨을 고르더라도, 정상은 꼭 밟아야 한다. 마지막 계단에서 발을 뗀 이에게만 그림 같은 풍광을 허락하기 때문이다.
드넓은 바다와 웅장한 산봉우리, 아담한 마을과 항구까지 한눈에 담긴다. 날씨가 좋으면, 뭉게구름이 발아래 깔려 천국에 오른 듯한 기분을 느낄 수도 있다. 정상부에서도 길 양옆은 가파른 절벽이라 긴장을 늦출 수 없지만, 산맥과 해안선이 눈에 익을 때까지 오래오래 머무른다.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권에서는 ‘자연을 누릴 권리’가 부여된다. 일명 ‘알레만스레텐(Allemansrätten)’, 누구나 제한 없이 자연을 누리되, 그만큼 아끼고 보호해야 한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노르웨이에서는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한, 경작되지 않은 땅에서 누구나 텐트를 치거나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다.
레이네브링엔 못지않게 아름다운 하이킹 코스 뤼튼(Rytn)에서도, 배를 타야 갈 수 있는 섬 베뢰위(Værøy)에서도 마찬가지. 그러니 로포텐 여행을 계획한다면 캠핑도 한 번쯤 고려하길 권한다. 노르웨이 땅을 밟았으면, 대자연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도 영위해봐야 하지 않을까.
이 콘텐츠의 원문은 GOLD&WISE에서 제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