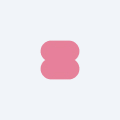Q. 고액 자산가 A 씨는 최근 신용카드 사용을 줄이고 현금 거래를 늘려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갑자기 현금을 많이 써버리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사실인지 궁금하다.
A.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목적 중 하나는 금융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신용카드나 계좌이체 같은 전자 거래는 흔적이 남아 추적이 가능하지만 현금 거래는 추적이 어려워 탈세나 범죄 자금으로 악용되는 경우가 많아서다.
정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라는 기구를 만들어 현금 거래를 감시·감독하며 자금세탁을 막고 있다. FIU에 쌓인 정보는 수집·분석을 거치며 불법적인 거래로 의심되면 검찰, 경찰, 국세청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세무조사에서도 FIU의 자료는 중요한 단서로 활용된다. 고액 자산가 A 씨도 갑자기 현금 거래가 많아지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세무조사 위험을 줄이는 현금 거래법
작게
보통
크게
국내 금융거래보고제도 잘 확인해야
하루 1000만 원 미만 현금 거래도
반복되면 금융당국에 보고될 수 있어
현행 고액현금거래보고(CTR) 제도는 은행, 증권사 등에서 동일인이 하루에 1000만 원 이상 현금을 입금하거나 출금하는 경우 거래 정보가 자동으로 FIU에 보고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1000만 원 미만으로만 거래한다면 아무런 제재가 없는지를 알려면 관련 제도를 좀 더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CTR 제도는 2006년 도입 당시 5000만 원을 기준으로 정했지만, 단계적으로 기준을 강화해 현재는 1000만 원이 됐다. 이 기준을 넘지 않는 현금 거래는 CTR에 의한 자동 보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CTR 기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계속 반복 거래를 한다면 이야기가 다르다.
금융거래보고 제도 중에는 CTR 외에도 의심거래보고(STR)라는 제도가 있는데, STR은 금액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STR은 금융회사가 불법 거래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을 때 직접 FIU에 보고하는 제도다.
불법 거래에 대한 판단은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평소 거래 상황, 직업, 사업 내용 등을 종합해 내리며, 각 금융기관의 내부 시스템을 활용해 불법 거래를 찾아내기도 한다.
따라서 명의를 분산시키거나 CTR을 피하려고 금액을 1000만 원 미만으로 쪼개 반복된 거래를 한다면 금융회사의 STR 조치로 FIU에 보고될 수 있다. 금융기관 직원은 FIU에 보고한 사실을 고객에게 누설할 수 없는 의무가 있다. 일반 개인은 본인 거래가 보고됐는지 알 수 없다.
얼마 전 유튜브에는 ‘국세청이 올해 8월부터 인공지능(AI)으로 개인 금융거래를 감시해 가족 간 50만 원만 송금해도 이를 포착해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가짜뉴스가 돌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식 해명하기도 했다.
다만 2020∼2024년 국세청 금융재산 일괄 조회 및 개별 조회 현황에 따르면 4년 전인 2020년에 비해 조회 건수가 60.9% 증가했다. 국세청이 보유한 금융 정보의 범위와 활용도가 확대된 것은 사실이다.
결론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일상적 현금 거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소득·자산과 명백히 괴리되는 과다한 현금 유입·유출이나 고의적인 쪼개기, 명의 분산 등 의심스러운 거래는 과세 관청의 의심을 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 콘텐츠는 '동아일보'에 등재된 기고글입니다.
이 글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소속 회사의 공식적인 의견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김도훈.jpg)